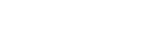피난교회, 철거할 수밖에 없다지만...
페이지 정보
본문

“혹시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성산포 피난교회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여태 이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피난교회가 문화재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피난교회의 소유주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일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유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지만, 현재는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문득, “이 마을 사람이고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던 강관규 장로의 말이 뇌리에 스쳤다. 강 장로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50년대 피난교회의 사진도 구하고, 사용승인 일자도 읍사무소에서 확인했으니 당장 도면의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다. 지금도 도면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강 장로에게 그간의 성과를 먼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피난교회를 매각하던 당시의 상황은 지난번에 어렴풋 들은 기억이 있었다. 1989년 당시 늘어나는 성도로 인해 예배드릴 장소가 비좁아지자 예배당을 신축할 필요를 느낀 성도들은 백방으로 자금을 마련해봤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합회의 지도를 받은 끝에 결국 피난교회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시 만난 강 장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기자의 기억에 살을 붙였다.
“이왕 팔기로 했으니 가능하면 최고 금액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합회에도 새로 짓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편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이는 5000만 원을 준다고 하고, 8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충분치 않았어요. 부지야 부복수 집사가 헌신한 땅이 있다지만 공사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뜩이나 제주도는 자재비가 육지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피난교회 소유주가 당시 교회에 제시했던 1억 원의 금액은 어쩌면 건축비용 마련에 난항을 겪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기자는 이번 취재를 진행하며 그에 대한 섭섭함과 야속함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피난교회를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강관규 장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성산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89년 피난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교회를 짓는다는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의 기자에게는 피난교회를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난교회 매각에 관해 당시 교회 구성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해 보였다. 그러던 차에 마승용 목사가 당시 호남합회 행정위원회 결의내용을 알려줬다. 그중 호남합회 ‘호행 89-82 결의’가 눈에 띄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산포 구교회의 대지와 건물을 6·25 기념관으로 보존결의(호행 88-83) 하였으나 현행 도시 계획상 철거가 불가피함으로 기념과 보존결의를 취소 결의함”
처음에 피난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왜 이 교회를 보존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건지 늘 궁금했다. 하지만 이때의 호남합회 행정위원회 결의내용을 보면 피난교회의 역사성을 인지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결의내용 중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었다. 바로 “철거가 불가피함으로”였다. 도시계획상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난교회는 지금도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정확히 말하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제주도에 와서 피난교회를 처음 본 날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이제야 알았다. 피난교회를 제외하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 것이다. 철거가 불가피하다던 피난교회가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일까.
30년도 전의 일이기에 도시계획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무작정 피난교회 인근의 음식점에 들어갔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장사한 노포란다. 그러니 도시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일렀지만 오히려 좋았다. 손님이 없어 주인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사하신지 30년도 넘었다던데 정말이세요?”
“그럼 정말이지!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어? 관광객 같은데”
“인터넷에서 봤어요. 여기 성산에서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던데요?”
“요즘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게 없는가 봐”
“그동안 도시계획이나 그런 거 없었나 봐요?‘
“없긴 왜 없었겠어”
그렇게 말을 꺼낸 주인은 아예 기자의 테이블 옆에 의자에 갖다 당겨 앉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부분 넋두리였지만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식사 후에는 인근 카페 두 곳에서 차를 마시며 주인에게 도시계획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 중 공통점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은 사실상 ‘죽은 계획’이 됐다는 것이다. 이유에 관해서는 각자의 해석이 달랐지만, 도시계획은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렇다저렇다 나름의 추측을 꺼냈지만, 기자는 어렴풋이나마 알 것만 같았다. 하나님께서 아직 피난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도시계획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테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까지 피난교회를 보존하신 것은 모두 지금을 위한 것이지 않았을까.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피난교회를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삼육대학교와 삼육서울병원의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
지방 4개 합회, 총회 ‘하루만’ 여는 이유는? 2024.12.27
-
서중한 ‘비전 및 선교전략연구보고서’ 발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