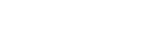‘차자자농장’ 김태연 집사의 태풍 속 한가위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기자
kbtlove@kuc.or.kr
입력 2022.09.09 18:39
글씨크기
본문
시골생활 위해 5년 전 귀농 ... 경작지 40% 낙과 피해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오전마을 거의 끝자락에 그의 집과 농장이 있었다. 물야교회의 김태연 집사를 만났다.
그는 이번 태풍으로 50주의 사과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피해를 입었다. 약 4000평 규모의 밭에서 40%가량의 낙과가 발생해 20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그나마도 현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실의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아내 황선미 집사는 땅에 떨어진 사과를 들어 보이며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현관에 붙어있던 비가림막이 강풍에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산자락에서 내려치는 돌풍에 나무가 견뎌나지를 못했다.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떨어진 나무도 있다”고 과수원을 가리켰다. 낙과가 고랑과 고랑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남편 김태연 집사는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다시 심느라 분주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았던 시간에도 한쪽 이랑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가 물먹은 벼처럼 누워있었다. 뿌리가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재식해야 한다. 김 집사 혼자 하루 사이에 30% 정도의 나무를 세웠는데, 역부족이다. 다시 심은 나무에는 빨간색 표식을 해 두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는 농부의 마음이 읽혔다.

젊은 부부는 5년 전 이곳에 정착했다. 춘양 출신인 김 집사가 부모님의 권유로 시골생활을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벌써 두 번째 재해를 입었다. 3년 전에도 태풍이 몰아쳐 올해만큼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에는 유달리 작황까지 안 좋아 마음이 더 착잡하다. 3개월 동안 극심하게 가물다가 그 뒤 석 달은 내리 비가 퍼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은 없었다.
탄저병까지 돌면서 홍로 품종은 아예 수확을 포기했다. 이제 막 발갛게 착색되려던 양광 품종은 강풍에 모조리 떨어졌다. 10월 중순이면 딸 수 있을 것 같았던 부사 품종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아직 다 영글지 않은 데다 맛이 들지 않아 즙으로도 만들 수 없다. 당국에서 가공용으로 수매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그대로 버려야 한다. 대출금을 생각하면 고민이 더 깊어진다. 보험처리도 만만찮다. 나무가 고사했는지, 과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들여다보는 조사원의 마음이 생산자의 마음과 같을 리 없다.
황 집사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한 해 수확으로 이듬해 먹고 사는 건데, 농사가 엉망이 되니까 다 놓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집사는 ‘혹시 독자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질문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10월 중순쯤 지나 부사 품종이 나오면 직거래로 구입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바람이 지난 자리에는 언제 태풍이 불었냐는 듯 뜨거운 뙤얕볕이 내리쬐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부부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은가”라며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도울 일손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인부 구하기가 쉽지 않다. 평소 같으면 지인들에게 요청할 텐데 명절 연휴라서 그조차도 어렵다.
취재를 마칠 즈음, 아들 정혁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어서 ‘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차자자’라는 농장이름도 아이의 옹알이에서 따왔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보면 아직 그의 밭에는 거센 비바람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나무가 있다. 여전히 탐스럽게 익어가는 사과가 달려 있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영농인의 꿈은 꺾이지 않았다. 아이를 얼싸안고 얼굴을 비비는 엄마 아빠의 입가에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다. 예약주문 및 직거래는 ☎ 010-7187-6563번.
#태풍힌남노 #재림교인피해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부부 독도화가’ 권용섭·여영난 화백 2024.12.20
최신뉴스
-
[오피니언] 인선에 밀려 ‘총회 정신’ 놓치지 않았나 2025.01.17
-
‘하루 총회’ 효율적 운영 VS 인선 위주 한계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