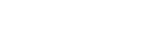축의금은 얼마나
페이지 정보
본문

당신의 결혼식 날, 아주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보내왔다고 해 보자. 아마도 당혹감, 의아함, 서운함, 노여움 등의 감정이 순차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그가 “너희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며 여행이 즐거웠냐고 묻는다면 어떤 표정으로 그를 대해야 할까? 언제일지 모를 친구의 결혼식 날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똑같이 5만 원만 보내면 될까 아니면 본래 생각했던 적어도 5만 원보다는 많은 축의금으로 ‘난 기브 앤드 테이크 스타일은 아니야’를 과시해야 할까? 어쩌면 찬란했던 우정은 5만 원 정도의 관계로 전락하다가 종국에 이를지도 모른다.
요즘 온라인에 축의금 관련한 글과 댓글이 자주 보이다 보니 한번 떠올린 상상이다. 하지만 기억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누구나 대략 비슷하겠지만 나 역시 결혼식 날 하객들의 축하에 연신 허리를 숙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고 정신을 차려 보니 공항에서 신부와 비행기를 기다리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열흘 후 집에 와서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의 봉투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내 쪽에서 봉투를 분실한 건 아닌지 많이 궁금했지만 끝내 물어보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 궁금함을 화제로 꺼내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서였다. 몇 년 후 그 친구의 결혼식에는 본래 내가 생각했던 금액을 넣었다.
코로나 이후 축의금 문화는 많이 바뀌었다.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물가와 함께 식대도 무섭게 오르다 보니 금액이 적으면 굳이 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게 예의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러니 청첩장을 받았을 때 갈지 안갈지, 혼자 갈지 가족과 동행할지, 장소가 호텔인지 일반 식장인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
축의금을 소재로 꺼냈을 뿐 우리는 일상에서 늘 소소하거나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린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했다.
“돈을 주거나 써 버리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 역, 2006)
이렇게 마땅한 때에 마땅한 양을 결정하는 역량을 그는 ‘중용(mesotes)’이라고 말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많이 다르지만 이 중용(中庸) 개념만큼은 그 차이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일치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유학에서 강조해 온 중용도 “과불급(過不及, 넘치거나 미치지 않는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든 유학이든 이 중(中)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오해를 피해야 하는데 산술적인 중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다. 여기와 저기의 거리가 100미터라고 할 때 50미터 지점에 말뚝을 박는 것을 중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내고 누가 7만 원을 낸다고 할 때 나는 5만 원을 내면 그것이 중용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가정 적절한 선택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운동선수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각색하면 이렇다. “어떤 선수에게 음식을 줄 때 불고기 10인분은 많고 2인분은 적다고 해서 6인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10이 넘치고 2가 부족하다고 해서 6이 적절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3-9 사이에 어떤 양이 적절한지가 다르다는 말이다. 이처럼 중용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용은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유학에서는 이 실천에 능한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다.
중용의 스펙트럼은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 있다.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잘지, 애인과 전화를 어느 정도 할지, 게임은 어느 정도 할지,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할지…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의 적절함을 요구받고 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넘침이나 모자람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달 말에는 친지들 사이에 작지 않은 경사가 있다. 내게는 여든을 앞두고 있는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형님 내외가 어찌나 아들의 혼인을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사에는 그에 비례하는 부담이 따라온다. 내 결혼식 때 형님이 얼마를 부조했는지 기억하고 있기에 그 부담은 아주 구체적이기까지 하다. 혹시 모를 가정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담에 대해 지난달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은 물론이다. 금액은 결정했고, 중용에 맞기만을 바랄 뿐이다.
- 이관호 철학자 -
- 다음글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