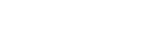멋쟁이 토마토는 왜 춤을 추는가?
페이지 정보
본문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찍)
나는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노래는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국민 동요’로 자리 잡은 ‘멋쟁이 토마토’이다.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야 춤을 출 거야”라고 외치는 마지막 토마토가 유독 눈길을 끈다. 왜일까?
그건 아마도 ‘춤추는’ 토마토가 남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토마토 인생에서 ‘주스’가 되고, ‘케첩’이 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토마토 주스나 케첩이 되면 대형 마트에서 멋진 상표를 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생을 살 수 있다. 주스가 되면 고즈넉한 카페에서 예쁜 컵에 담겨 우아한 삶을 살 수 있고, 케첩이 되면 식당에서 감자튀김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토마토의 생에서 주스나 케첩이 되는 것은 누구나가 꿈꾸는 소위 ‘메이저’ 한 삶의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반면 ‘춤추는’ 토마토, 그것도 ‘울퉁불퉁한 몸매’를 스스로 멋지다고 착각하며 춤추는 토마토는 ‘마이너’ 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주스나 케첩처럼 ‘완제품’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책 없이 춤을 추겠다고 하니 토마토의 부모가 들으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하지만 역으로 춤추는 토마토가 눈길을 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춤추는 토마토의 진짜 매력은 남들과는 달리 자기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
딴따라 정신의 재해석
어린 시절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오랜만에 열어 보았다. 당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는 이름과 사진 옆에 자신의 장래 희망을 적는 칸이 있었다. 거기에는 자기 꿈인지 부모님의 꿈인지 알 수 없는 직업이 쓰여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대부분 의사 아니면 판검사였다.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춤추는’ 댄서가 꿈인 친구는 없고, 그 비슷한 꿈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어린 시절 공부 안 하고 춤추러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커서 딴따라 될래?” 그렇게 비하의 대상이었던 ‘딴따라’는 최근 K-pop의 세계적인 열풍과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인기 스타로 거듭났다. 시대는 이렇게 ‘개벽’하고 있다.
내 생각에 과거의 비하의 대상이었던 ‘딴따라’라는 표현은 21세기에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무대 체질, 남들 앞에서도 긴장하거나 ‘쫄지’ 않는 자신감이나 배짱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청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리더십, 더 나아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는 소신이나 주관과 다르지 않다. 울퉁불퉁한 몸매를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며 춤을 추는 토마토 정신이 바로 딴따라 정신이다.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는 2022년에 『Re-Framing ‘Growing Up’ For a New Age』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에 ‘성장’을 재구성하기』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번역 출간할 때는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라는 기가 막힌 제목을 달았다. 그렇다. 새로운 시대에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와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있던’ 방식, 아니 세상에는 오로지 이것만 있다고 착각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프렌스키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아이들의 성장을 재구성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낡고 오랜 기존의 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춰 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럼 춤은 누가 춰?
그야말로 의대 광풍(狂風)의 시대다. 대다수의 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의대에 가겠다고 결심한다. 수능 시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의사 고시’로 불린 지 오래다.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직업인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너도나도 의대‘만’ 가겠다니 그것이 문제다. ‘나는 왜 의대에 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성찰 없이 일단 시험만 잘 보고 의대에 들어가면 그때 성찰도 하고 소명도 찾고 적성은 끼워 맞추면 된다고 한다. 아니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돈만 잘 벌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치동 학원가 ‘의대 준비반’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 한 유튜버가 ‘의대반’ 초등학생에게 “왜 의사가 되고 싶니?”라고 묻자 “몰라요.”라고 대답한 것은 의대 광풍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컬 캠프’도 유행하고 있다. 나는 순진하게 메디컬 캠프가 의료 봉사대인 줄 알았는데 의대 진학을 위한 학습 전략을 전수해 주는 사교육 시스템이라고 한다.
최근 의대 증원 소식에 의대 광풍은 더욱 휘몰아치고 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과장도, 40대 공무원도, 50대 금융맨도 의대 입시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고2 아빠도 수험생인 아이와 함께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자 한 칼럼니스트는 모두가 의대에 가면 “소는 누가 키워?”라고 반문했다. 모두 케첩이나 주스만 되겠다면 춤은 누가 추겠는가?
영화 ‘조조 래빗(Jojo Rabbit)’에서 아이들은 히틀러라는 망령과 그 망령을 추종하는 망령들 틈에서 망령이 되지 않기 위해 사투한다. 주인공 ‘조조’는 나치의 눈을 피해 다락방에 숨어 사는 유대인 소녀에게 묻는다. “나중에 다락방을 나가게 되면 뭘 하고 싶어?” 그 소녀는 춤을 추고 싶다고 말한다. 결국 그 망령된 세상에서 끝내 살아남은 아이들이 두둠칫 춤을 추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다. 아이들이 이 망령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두둠칫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 춤추는 토마토처럼 말이다.
- 노동욱 문학사상 편집기획위원 -